시인 한하운
인천의문화/김윤식의 인천문화예술인 考
2008-05-20 21:11:45
인환(人寰)의 거리에서 부는 보리피리, 시인 한하운
김윤식/시인·인천문협 회장
그러려니 짐작은 했어도, 한하운(韓何雲, 1919~1975) 시인에 대해 우리 인천 문단사(文壇史)에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그 문단사가 곧 『인천시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니 거기에도 당연히 그의 이름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불문가지(不問可知). 누구나 기피하는 그의 천형(天刑)의 몸뚱이! 문단이란 데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을 테니.
“그는 40년대 말 방랑 끝에 문득 문단의 국외자(局外者)로 등장했다. 그러나 「유리(遊離)의 가두(街頭)」에서 하루아침에 시인이 되었던 그의 생애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받았고 나시인(癩詩人)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홀대를 감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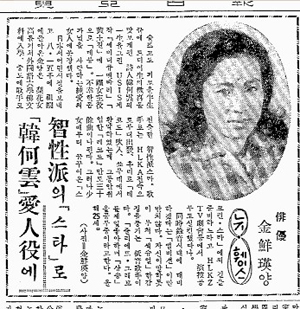
소설가 김용성(金容誠)이 그에 대해 쓴 이 글에도 당시 그의 ‘문단 국외자’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실상이 이랬다 하더라도 분명 한때나마 인천에 자리를 잡고 살다 떠난, 한국 문학사에서 그의 이름 석 자를 지울 수 없는 엄연한 인천 연고 시인에 대해 이토록 냉정하다 싶을 만큼 깨끗하게 행적 한 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하운은 본래 함경남도 함주((咸州) 출생이다. 본명 한태영(韓泰永)을 가리고 하운(何雲)으로 이름을 고친 것은 그가 나병화자로 “전신에 고름이 흐르고 방안에는 악취가 풍기던” 그 무렵부터 1948년 월남할 때까지 4년간의 처절한 투병 기간을 거치면서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구가하려는” 최후의 의도였다.
그러나 1949년 잡지 『신천지』에 나병의 고통과 슬픔을 노래한 「전라도 길」등 시 13편을 발표하면서 그는 죽음이 아닌 시인의 길을 가게 된다. 절망에 빠진 그를 그야말로 ‘신천지’로 안내한 사람은 이병철(李秉哲)이란 인물이었다. 이병철의 소개로 일약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한하운은 1949년 첫 시집 『한하운시초』를 펴내면서 더욱 문둥병 시인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나문학(癩文學)이랄까…. 환자들의 고심 속에서 우러나는 작품을 정음사(正音社)는 다루었습니다. 소설에 『애생금(哀生琴)』, 시에 『한하운시초(韓何雲詩抄)』 모두 다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 두 작품이 우수하고 우리 마음을 찌름을 느꼈습니다.”
1949년 8월 15일 건국 1주년을 기념해 경향신문이 주최한 ‘건국과 함께 자라는 문화’라는 좌담회에서 당시 정음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던 최영해(崔暎海) 주간의 말이다. 잡지 『신천지』에 실린 한하운의 시를 보고 정음사가 무조건 그의 시집을 내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다시 김용성의 글로써 확인해 보자.
“그리하여 1949년 『신천지』 4월호에 「한하운 시초」라 하여 무려 13편의 시가 한꺼번에 실렸다. 선자(選者) 이병철(李秉哲)은 거기 「한하운 시초를 엮으면서」라는 글에서 ‘내가 불우의 시인, 천작(天作)의 죄수, 하운 형(何雲兄)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첫여름이었다. 친구 박용주(朴龍周) 형의 간곡한 소개로 정처 없는 유리(遊離)의 가두(街頭)에서 방황하고 섰는 걸인 하나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쓰면서 그의 시를 처절한 생명의 노래요, 높은 리얼리티를 살린 문학이라고 소개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룸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꼬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꼬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 리 먼 전라도 길.
-「전라도길 49」-
‘소록도로 가는 길에’란 부제가 붙은 이 시는 커다란 반응을 일으켜 「정음사」에서는 무조건 시집을 내겠다고 나서 그는 명동 성당의 방공호에서 원고를 정리했다. 그리하여 그의 첫 시집인 『한하운시초』(26편 수록)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하운은 함남 함주군 동촌면(東村面) 쌍봉리(雙峰里)에서 한종규(韓鍾奎)의 2남3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3대가 과거에 급제한 선비 집안으로 제법 큰소리치는 지방 지주였다고 한다. 그런 사실은 그의 자서전인 『나의 슬픈 반생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하운은 1926년 초등학교인 함흥제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집안 내력이었는지 내내 우등생이었으며, 특히 음악과 미술에 자질을 보였다고 한다.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것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기 전 해인 1931년 5학년 봄부터였다. 몸이 무겁고 붓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를 따라 한 달 남짓 온천과 삼방(三防) 약수터를 다니며 요양을 해 보기도 했지만, 이것이 나병 발병의 시초였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1932년 보통학교 졸업과 동시, 한하운은 이리농림학교(裡里農林學校)에 입학해 수의축산(獸醫畜産)을 공부한다. 이 학교는 상당히 어려웠던지 함남도청 관내 19명의 응시자 중 유독 그만이 합격이 되었다고 한다. 입학해서는 장거리 육상선수로 활약했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운동을 그만둔 3학년 때부터 한하운은 헤세, 발자크, 지드를 탐독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이때 끝내 R이라는 이니셜로만 남은 구원의 여성을 만난다. 동향이었던 그녀는 그가 나중에 월남할 때까지 그의 병고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간호를 했다고 한다. 아무튼 1936년 봄, 마침내 경성제대(京城帝大) 부속병원은 그에게 나병화자임을 확정 진단한다. 『나의 슬픈 반생기』에 기록된 그 순간에 대한 그의 고백이 우리 마음을 한없이 훑어 내린다.
“5학년 졸업반이던 36년 봄이었다. 몸 전체의 말초부 양역(陽域)에 콩알 같은 결절(結節)이 생기고 궤양이 끝없이 퍼져 나가자 여기저기 진찰을 받다가 성대(城大)(현 서울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기다무라(北村淸一) 박사는 신경을 만지고 바늘로 피부를 찌르곤 하였다. 진찰이 끝난 뒤에 조용한 방에 나를 불러놓고 마치 재판장이 죄수에게 말하듯이 문둥병이라 하면서 소록도(小鹿島)로 가서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다. 나는 뇌성벽력 같은 이 선고에 앞이 캄캄하였다.”
이번에는 다시 김용성의 기록을 좀 더 따라가 보자.
“37년 이리농림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그의 병은 다소 낫는 듯했다. 그래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성계고등학교라는 곳에 입학했다. 그러나 2년 남짓 지나면서 다시 병세가 악화하여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귀국했다. 열심히 치료를 하면 병은 또 나아지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중국 북경으로 가서 북경대학 농학원 축목학계에 입학했고, 「조선 축산사(朝鮮畜産史)」라는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했다. 그것이 43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환부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귀국해 일단 고향으로 간 그는 1944년 함경남도 도청 축산과에 취직한다. 그리고 5월 도내 장진군 개마고원으로 의원(依願) 전근한다. 집에 있기가 싫어서였다. 다시 가을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전근한다. 그의 병은 개마고원의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1945년 봄, 병이 크게 악화되자 그는 직장을 사직하고 함흥 중앙동으로 귀가한다. 이때부터 R의 도움을 받아가며 치료에 전념하며 문학 공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후 그에게는 쓰라린 인생 역정과 문학적 성공이 교차하게 된다.
8·15 광복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산을 몽땅 빼앗기면서 아우의 뒷전을 따라다니며 벌인 노점 책장사, 그 후 <건국서사(建國書肆)>라는 책방 개업, 그러다가 1946년 3월 함흥 학생 데모대로 인한 곤욕, 1947년 4월 북괴 전복(顚覆) 의거를 꿈꾸던 아우의 체포와 그의 원산형무소에 투옥. 그러나 그는 나병 악화로 인해 가석방되지만 그를 정성껏 간호하던 R 여인도 아우와 함께 투옥된다.
출옥 후 다시 38선을 넘어 남행, 치료약을 구한 뒤 다시 월북한다. 그러나 당국은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그를 다시 투옥한다. 이어 탈주, 또 한 번의 남하, 그리고 남한 각지를 돌며 구걸 행각을 벌인다.
그의 자서전은 1947년 동지(冬至) 무렵 헌가마니를 덮고 자던 거지 동료의 죽음을 보고 더욱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음을 밝힌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 그는 “명동거리에서 바, 다방, 음식점, 상점 같은 곳의 출입구를 막아서서 돈을 받아 내거나 시를 팔아 연명했다. 어느덧 명동거리에서 시를 파는 사람으로 유명해진 한하운은 몇몇 문인들을 사귀게 된다.” 이런 역정 속에서 이병철을 만나게 되었고 『신천지』잡지에 시를 발표하면서 정음사에서 첫 시집도 발간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과의 인연은 1950년 3월 부평 소재 나환자 정착촌 <성계원>으로 이주, 자치회장이 되면서 시작된다. 이어 그는 1952년 5월 부평에 <신명보육원(新明保育院)>을 창설하고 원장이 된다.
“그런데 53년 여름 그와 그의 시가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른바 ‘나시인사건(癩詩人事件)’으로, 발단은 아마도 『한하운시초』 재판(再版)이 6월에 나오면서부터로 보인다. 1953년 8월 1일부터 주간지 <신문의 신문>이 ‘문둥이 시인 한하운의 정체’라는 타이틀로 한하운을 문화 빨치산이라 말한 데서 사건은 일어나고 심지어 한하운이라는 나의 아호마저 국가 멸망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며, 시의 내용마저 적색시(赤色詩)라는 것이며,” 한하운의 자술대로 “혹독하게도 나 자신마저 허구의 인물이라고 날조하여 떠들어”대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그를 취재했던 오소백(吳蘇白)의 회고담에서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최초의 『한하운시초』 중에 「데모」라는 시가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 ‘핏빛 깃발이 간다’라는 표현이 있었다. 당시 평론가 이 모라는 사람이 정음사(正音社)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양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 동기는 시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었으나 한하운이란 인물이 실존함은 물론, 그의 시도 불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1975년 부평구 십정동 자택에서 지병인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말년에 시작 활동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송사에 얽힌 기록도 있으나, 끝내 나병을 근치토록 한 그의 시심(詩心)과 인간 승리는 우리를 다함없이 숙연하게 한다.
“시가 나에게는 제2의 생명이다. 아니 전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소망을 잃어버린 어두운 나에게 스스로 백광(白光) 같은 빛을 마련해 주고, 용기와 의지의 청조(晴條) 길로 나를 인도한다”라고 했듯이 시인 한하운은 시 작업을 그의 모든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절망과 고독을 딛고 나병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보리피리」와 같은 한스러움이 넘쳐 차라리 아름다운 한국적 가락을 읊어내는 위대함을 보여 주었다.”
인천에는 없는 그의 시비(詩碑)가 1973년 전남 고흥군 도양면 소록도에 세워졌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ㄹ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릴 때 그리워
피―ㄹ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ㄹ닐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ㄹ닐리리.
인환의 거리에서 불어 보는 그 애절한 보리피리 소리가 들린다.
'김윤식의 인천문화예술인 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인’ 최경섭 (0) | 2023.04.27 |
|---|---|
| 박영성 화백 (0) | 2023.04.27 |
| 시인 최승렬 (1) | 2023.04.27 |
| 화가 이달주 (0) | 2023.04.26 |
| 화가이면서 인천시장이었던 윤갑로 씨 (0) | 2023.04.26 |



